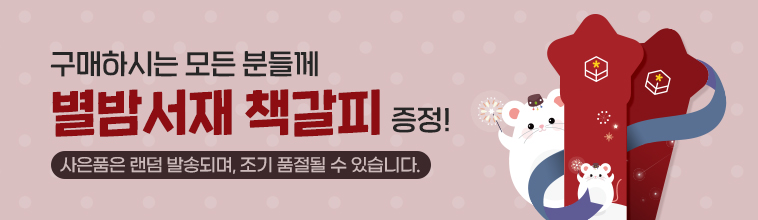관련도서
상품 정보
책 소개
음악에 관한 어떤 산문시
책 상세소개
조연호라는 이름. 199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6권의 시집을 펴냈고, 그 여섯번째에 스스로 『유고(遺稿)』(문학동네, 2020)라 이름 붙인 시인. 김행숙 시인의 호명을 빌려오자면, 그는 ‘미지의 X’로 향하는 자이면서 미지의 X를 발견하는 자, 그리하여 기어이 스스로 미지의 X가 된 시인이기도 하다. 이토록 밀도 높게 희미한, 가장 난해하면서 가장 투명한, 이 모든 모순 형용을 고스란히 언어로 이룩하는 시인. 난다에서 다시 엮은 『행복한 난청』은 2007년 출간되었던 그의 첫번째 산문집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15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새로이 읽히는 글임은 시인 조연호가 앞선 것이 시대가 아니라 시라는 장르 자체인 까닭이다. 시를 넘어 시를 벗어나 마침내 시를 이루는 글편들, 그 머리에 달아둔 ‘음악에 관한 어떤 산문시’라는 부제가 끝내 부연일 수밖에 없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이 책이 시인지 산문인지 소설인지 구분하려는 노력은 “이것은 음악에 대한 나의 소견”일 뿐이라 무심히 말하는 시인에 이르러 반드시 실패할 것이므로. 그 섬의 많은 사람은 나무 아래 수목장으로 묻혔다. 나무와 숲은 그들과 함께 영생한다. 그때 나무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이어가는 영생목(永生木)이 된다. 망자들이 산 자들과 열매를 나눈다. 그렇게 믿고 싶다. 스쳐간 모든 것이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정확하게 나를 외면하기를 기다린다. 속도는 시간의 형체일 수 있다. 시간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밤과 낮의 습관일 뿐, 새들은 하루를 날아갔지만 늘 입구에 서 있었다. 기다렸다. 허탈을 몰랐다. 지루한 장마였고 멋진 번개였다. _85~86쪽
목차
서序─곰방대를 든 연당여인蓮塘女人_7
신들의 새벽으로 떠나는 인간의 저녁_11
Jeff Mangum, 《Orange Twin Field Works Vol.I》, 2001
희디흰, 내세來世가 없는 길몽吉夢_23
White Noise, 《An Electric Storm》, 1969
오필리아, 기면발작嗜眠發作의 꿈_37
Laurie Anderson, 《Big Science》, 1982
간화선看話禪의 반대편-시詩에 관한 것들_53
H?lderlin, 《H?lderlins Traum》, 1972
토란향_63
Harmonia & Brian Eno, 《Tracks & Traces》, 1976
대살代殺, 큐비즘의 날들_71
Exuma, 《Exuma》, 1970
지베르니 정원의 부엽浮葉들_87
Harmonium, 《Si on avait besoin d'une cinqui?me saison》, 1975
금요일의 자매들_101
Azure Ray, 《Burn and Shiver》, 2002
침소寢所의 무늬_113
Huun-Huur-Tu, 《The Orphan's Lament》, 1994
산 자의 인력, 죽은 자의 척력_125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먼지의 절기들_143
Aster Aweke, 《Aster's Ballads》, 2004
별자리의 산란기_149
Hawkwind, 《Space Ritual》, 1973
거울 앞의 놀이들_161
Psychic TV, 《Force the Hand of Chance》, 1982
축제/네크로필리아_173
Garmarna, 《Vittrad》, 1993
서랍 속의 생물들_185
Tom Tom Club, 《Tom Tom Club》, 1981
밤의 세공술_195
Kishori Amonkar, 《Samarpan》, 2003
……로 갔던 사람들_209
한유주, 『달로』, 2006
몽상어 편람夢想語 便覽_237
The Magnetic Fields, 《69 Love Songs》, 1999
눈이 내리는 방_245
Robert Johnson, 《The Complete Recordings》, 1990
위경僞經의 낮, 진경眞經의 밤_253
Boubacar Traor?, 《Je Chanterai Pour Toi》, 2003
망각의 의자_271
요가 선생을 둘러싼 담론
신들의 황혼/별사냥_275
Musa Dieng Kala, 《Shakawtu》, 1996
배농排膿_283
Nikhil Banerjee, 《Raga Malkauns》, 1998
종終─처네를 쓴 여인_291
신들의 새벽으로 떠나는 인간의 저녁_11
Jeff Mangum, 《Orange Twin Field Works Vol.I》, 2001
희디흰, 내세來世가 없는 길몽吉夢_23
White Noise, 《An Electric Storm》, 1969
오필리아, 기면발작嗜眠發作의 꿈_37
Laurie Anderson, 《Big Science》, 1982
간화선看話禪의 반대편-시詩에 관한 것들_53
H?lderlin, 《H?lderlins Traum》, 1972
토란향_63
Harmonia & Brian Eno, 《Tracks & Traces》, 1976
대살代殺, 큐비즘의 날들_71
Exuma, 《Exuma》, 1970
지베르니 정원의 부엽浮葉들_87
Harmonium, 《Si on avait besoin d'une cinqui?me saison》, 1975
금요일의 자매들_101
Azure Ray, 《Burn and Shiver》, 2002
침소寢所의 무늬_113
Huun-Huur-Tu, 《The Orphan's Lament》, 1994
산 자의 인력, 죽은 자의 척력_125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먼지의 절기들_143
Aster Aweke, 《Aster's Ballads》, 2004
별자리의 산란기_149
Hawkwind, 《Space Ritual》, 1973
거울 앞의 놀이들_161
Psychic TV, 《Force the Hand of Chance》, 1982
축제/네크로필리아_173
Garmarna, 《Vittrad》, 1993
서랍 속의 생물들_185
Tom Tom Club, 《Tom Tom Club》, 1981
밤의 세공술_195
Kishori Amonkar, 《Samarpan》, 2003
……로 갔던 사람들_209
한유주, 『달로』, 2006
몽상어 편람夢想語 便覽_237
The Magnetic Fields, 《69 Love Songs》, 1999
눈이 내리는 방_245
Robert Johnson, 《The Complete Recordings》, 1990
위경僞經의 낮, 진경眞經의 밤_253
Boubacar Traor?, 《Je Chanterai Pour Toi》, 2003
망각의 의자_271
요가 선생을 둘러싼 담론
신들의 황혼/별사냥_275
Musa Dieng Kala, 《Shakawtu》, 1996
배농排膿_283
Nikhil Banerjee, 《Raga Malkauns》, 1998
종終─처네를 쓴 여인_291
책속으로
잘 만들어진 음악의 다수는 듣는 이와 만드는 이 사이의 왜곡을 매개로 한다. 자연음은 ‘음향’은 될 수 있어도 ‘음악’은 될 수 없다. 연주자와 청자 사이에 규약된 질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산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한줌은 ‘좋은 음악’이 될 수 있는 반면, 음반에 담긴 바람 소리만으로는 ‘음악’이 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왜곡이라는 굴절을 통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글쓰기에서도 비슷하다. 보르헤스의 「알레프」처럼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설득 매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투명함이 문학의 미덕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정교하게 세공된 왜곡을 나는 그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복수 교차되는 여러 기준 가치는 세상을 아주 해독하기 어려운 실뭉치로 만들어버리곤 하지만, 해독 불가 문제지의 답변 항목에 가장 좋은 해답을 써넣을 수 있는 수험자는 해독 불가 그 자체를 답변으로 받아들이는 자, 문제를 다시 문제화하는 자뿐인 것이다._「간화선看話禪의 반대편-시詩에 관한 것들」, 57쪽제발, 제발, 애원식의 편지를 쓰긴 싫었다. 내 등뼈를 만지고 나를 물고기라고 부르던 사람이 있었다. 가시에게 반하겠어, 여름 숲길의 장미 덩굴에게 반하겠어. 난 노란 모자를 썼고 오늘은 놀러가는 놀이와 놀러 나가지 않는 놀이를 하는 날. 멀리 있는 것들은 갈 수 없어 슬픈 게 아니라,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슬픈 것이다. 곤혹이라는 이름으로, 지옥문 앞의 흰 사제들과 만나 라일락 아래의 검은 제의를 올린다. 그것은 리듬이고 노래고 선물이다. 나는 배고픈 염소처럼 종이를 씹고 내가 쓴 글자만큼만 울었다._「대살代殺, 큐비즘의 날들」, 85쪽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며 나는 밤길을 걸었다. 인적은 없고 버려진 자전거는 검은 손으로 안장만 반짝반짝 닦고 있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며 나는 몹시 지쳐가고 있었다. 설탕이 먹고 싶었고 더운 내 등에 귀를 대고 싶었다. 내 그림자 속에 손가락을 넣고 등불은 혀와 코를 만든다. 여러 색 색연필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빈칸이 많은 일요일뿐. 아이들은 노는 일에도 번거로운 순서가 너무 많았고, 고리가 많은 외투 때문에 옷을 벗을 때도 옷을 입는 것처럼 보였다.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라는 사람을 사랑할 때 불 켜진 간이화장실에서는 여자애들만 걸어나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 문패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소리, 엄마 뱃속에서 발가락이 자라고 그때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니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며 나는 걸었고 등불이 내 그림자를 만질 때마다 눈이 생겼고 귀가 돋았다. 기억할 수 없는 것들만 꿈이 될 자격이 있는 걸까?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말하며 나는 밤길을 걷는다._「거울 앞의 놀이들」, 162쪽피가 흥건한 귀이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는 열여섯 살의 인도 소년처럼 수많은 먼지와 친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오직 나와 나의 팔다리만 알 수 있는 먼지들 속으로,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던 자포자기들 속으로, 그리고 지속되는 난청과 환청. 천천히 허공 속으로 섬들이 떠오른다. 고립이라는 형벌로 허공은 인간을 오랫동안 물밑에 세워두었었다. 내 장례식에 틀고 싶은 음악과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듣고 싶은 음악, 난청 그리고 환청_「……로 갔던 사람들」, 226쪽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의 싸움이 생기는 것이라면,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능의 싸움이 생긴다. 그리고 인간은 이 둘을 세계의 야경夜景으로 흐릿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불은 어둠 모두를 태울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을 능멸할 수는 없다. 그렇게 불에 가장 그슬린 인간이 탄생할것이다. 불운은 쥔 동전을 버리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쥐고 다른 동전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날들은 언제나 깃털과 같은 무게로 우리를 바닥까지 끌고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추악醜惡은 우리 세계의 재능을 우리 이외의 세계로 물들일 것이다. 태어날 곳이 사라진 사람이여, 우연찮게 너의 농담은 아름다웠다. 그런 네가 아직도 인간에게 들려오는 음식을 쪼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어와 언어의 기계로 만들어진 세계가 단지 그걸로 안전하다면 세계는 나의 안전만큼 불안을 빼앗긴 셈이라고 생각했다._「배농排膿」, 288쪽
출판사 서평
무형 속의 유형, 유형 속의 무형『행복한 난청』은 분명 음악에 관한 글들이지만 이를 쓴 시인 조연호를 두고 ‘음악에 조예가 깊다’고 평한다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언어로 음악을 짓는다’고 말해도 미진함이 있다. 조연호의 시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음악’이라 말한다면 간신히 근처에 이를 수 있겠다. 그의 첫 시집 『죽음에 이르는 계절』의 제목이 마우로 펠로시(Mauro Pelosi)의 곡명에서 따왔음을 떠올리게도 된다. 그렇다면 이 책 또한 ‘음악에 대한 소견’을 넘어 ‘그 자체로 음악’이라 말해보면 어떨까.한 편의 글마다 하나의 음악 앨범을 소개하고 있으나 그 뮤지션의 이름들은 적잖이 생경하다. 독일 밴드 횔덜린(H?lderlin)부터 인도의 민속음악가 키쇼리 아몬카르(Kishori Amonkar), 국명마저 낯선 러시아 연방 투바공화국의 훙후르투(Huun-Huur-Tu), 카리브제도 바하마의 엑수머(Exuma)에 이르기까지, 소위 ‘월드뮤직’이라 불리는 전 세계 곳곳의 음악을 아우르지만 이 지형도의 본질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그의 글을 따라 종으로 횡으로 교차하다보면 우리는 단순히 다양한 음악을 알게 되는 대신 ‘음악’의 심층에 도착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행복한 난청』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떤 앨범, 하나의 곡(piece)이 아닌 음악의 본령 그 자체다.요컨대 『행복한 난청』은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대신 음악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해도 좋겠다. 음악 바깥을 서성이는 듯한 조연호의 문장, 그 파편들을 따라가는 길은 나선이고 이 책의 중심이 곧 미로의 한가운데다. 음악에 대한 여정이되 멜로디도 리듬도 아닌 무언가, 음표와 쉼표를 동시에 지워내는 무언가, 다만 소나기처럼 우리를 적시는 그것은 결코 ‘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다. 마침내 우리는 음가 없는 음악에 흠뻑 젖어 나올 것이며, 끝내 그 ‘곡’에 대해선 무엇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조연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무엇도 듣지 않으면서 음악을 경험한다. 책의 제목에 ‘난청’과 ‘행복’이 나란한 이유일 테다.인디 록밴드 뉴트럴 밀크 호텔을 이끌며 곡을 쓰는 것을 제외하면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며 음악을 채록(field recording)하는 것만이 취미인 그리스인 제프 맹검에 대해,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달고 발표 할 수 있는 음반인지에 대해, 나는 반문하지 않기로 한다. 패러디의 미학도 미학이고 키치의 미학도 미학일진데 어찌 채록에 미학이 없겠는가. 단지 바라보는 것, 현실세계를 투영하는 앵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미학이 만들어지는 것을 익히 보아왔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주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크레디트에 늘 이 앨범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 채록하는 자의 심미안 자체를 음악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정서에 나는 뜬금없이 감동받곤 한다. _14쪽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듣고 싶은 음악,난청 그리고 환청이번 개정판을 펴내며 「배농排膿」이라는 이름의 한 꼭지를 더했다. 그의 시집 『농경시』(문예중앙, 2010)와 이어지고 얽히되 이 책의 말미에서 전혀 새로운 조성(調性)으로 울리는 글이다. 시이면서 동시에 산문인 글, 산문으로서 시에 이르는 글이기도 하다. 장르에서 벗어나 장르로부터 가장 자유롭기에 장르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시인 조연호의 힘인 까닭이다. 『행복한 난청』에서 그 경계를 지우는 무한한 교차를 발견한다면 차학경의 『딕테』를 떠올릴 것이고, 음악에 관한 글이 스스로 음악이 되는 곡절을 따라간다면 파스칼 키냐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닮음이라는 구획에서조차 놓여나 또 저만치 멀리서 앞서 걷고 있는 시인 조연호의 뒷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미래의 글쓰기가 시인의 걸음이라 한다면 쥘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기어이 들을 수 없는 이 난청, 끝내 볼 수 없는 난시야말로 우리가 시인 조연호의 뒤를 따르는 방식이겠다.이로써 난다에서 이전에 펴낸 바 있는 조연호의 두번째 산문집 『악기(惡記)』(2017)의 곁에 첫번째 산문집 『행복한 난청』을 놓게 되었다. 두 책 모두 이연미 작가의 작품으로 표지를 이었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두 산문집이 5년이 흘러 나란히 놓이는 셈이다. 변주이자 화성(和聲)이라 말해도 좋겠다. 어쩌면 시인은 다카포(da capo, 처음부터)라 이를 것이다.드럼을 치던 녀석들도, 노래를 부르는 녀석들도, 베이스를 치던 녀석들도 많았지만 이제 뭔가 음악 이외의 것을 하며 살아가고 모두를 용서해도 자기 자신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코뿔소의 뿔처럼 딱딱한 각질의 손끝들을 만져보고 단순한 말이 왜 타인을 납득시키기엔 독약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건 나는 그걸 ‘다카포’라고 부른다. 코 위에 돋거나 손끝에 돋거나 그건 아무리 봐도 서로 다르지 않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부서진 채 뿔들을 주고받았으니까. 도돌이표가 있었지만 거기엔 돌아가야 할 곳이 없었다. _191쪽
상품 정보 고시
| 도서명 | 행복한 난청 |
|---|---|
| 저자 | 조연호 |
| 출판사 | 난다 |
| 출간일 | 2022-08-16 |
| ISBN | 9791191859294 (1191859290) |
| 쪽수 | 296 |
| 사이즈 | 138 * 210 * 23 mm /475g |
사용후기
회원리뷰 총 0개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총 0개의 상품문의가 있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반품
교환 및 반품
[반품/교환방법]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 반품/교환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0435)로 문의 바랍니다.
[반품주소]
- 도로명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62-20 (산남동)
- 지번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05-21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14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단순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행복한 난청